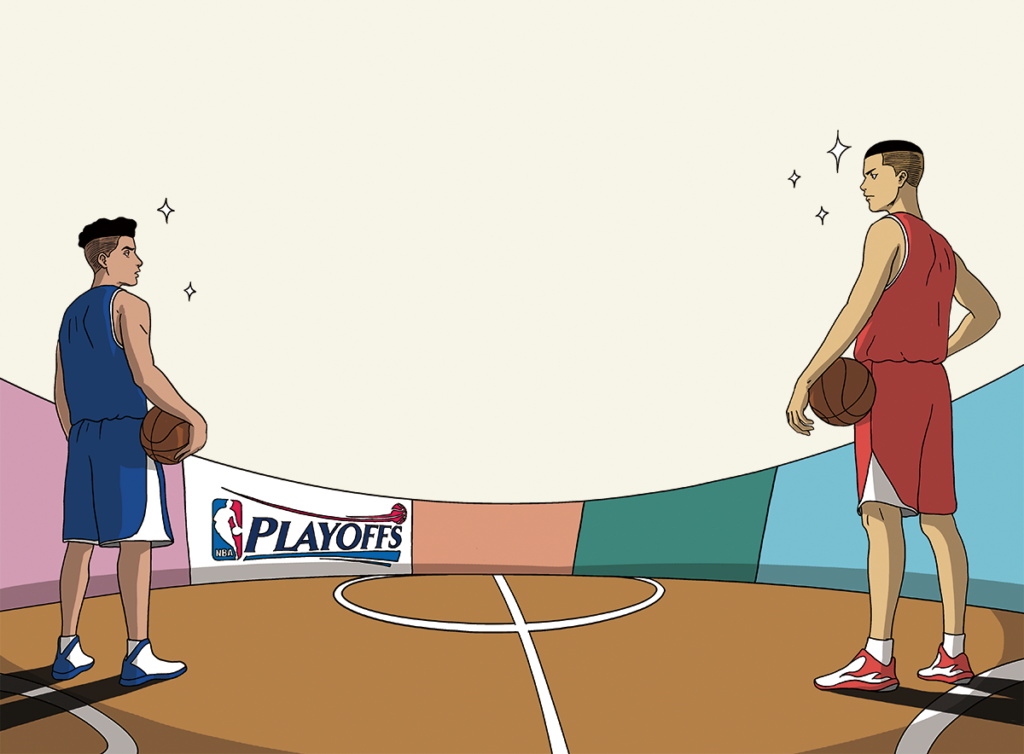
만화책 <슬램덩크> 빈칸에 대사 채워 넣기 대회가 있다면 전국 10등 안에 들 것이라 자부하던 시절이 있었다. 내 농구 인생과도 같던 <슬램덩크>는 우울증 치료제이자 감수성 증폭기였다.
산왕전 마지막 순간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뻔히 알면서도 읽을 때마다 감동하곤 했다. ‘그래, 팀스포츠란 이런 거지’ 하며. 영화관에서 볼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첫’ 관람만큼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보겠노라며 시사회도 마다한 채 개봉한 지 일주일이나 지나서 봤는데, 대사 없이 진행된 마지막 득점 쟁탈전에서는 거의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친구는 울지 않았다고 우겼지만, 자세를 보아하니 이미 여러 차례 눈물을 훔친 듯했다. 일명 ‘N차 관람’ 을 즐긴 우리 세대 <슬램덩크> 팬들은 대부분 우리와 같은 현상을 경험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농구에 미쳐 살던 청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스포츠 만화가 주는 특유의 감동 때문인지는 제각각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노우에 다케히코 작가가 삽입한 여러 장치는 <슬램덩크>가 단순히 ‘추억팔이’에만 집중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01년 <슬램덩크>가 ‘완전판’이라는 타이틀로 새 버전의 단행본을 내고, 몇 년 뒤부터 일본은 큰 미션에 도전한다. ‘일본 선수 NBA 보내기’였다. 키가 173cm밖에 안 되는 단신 가드, 다부세 유타가 도전을 시작해 2004년 피닉스 선즈 유니폼을 입고 정규 경기를 뛰었다. 키 170cm의 여자 농구 선수 오가 유코도 2008년 미국 여자 프로 농구(WNBA) 무대를 밟았다. 두 선수를 보는 우리 시각은 냉담했다. ‘자본의 힘’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고, “우리 가드에게 한참 못 미친다”며 헛된 도전에 냉소적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NBA에는 일본인 선수가 두 명이나 뛰고 있다. 자본의 힘이라고 말했다간 망신을 당할 것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몸소 실천한 끝에 450여 명의 실력자들 틈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그사이 일본 여자 농구는 도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다. WNBA에서 뛰고 있는 포인트가드 마치다 루이는 162cm인데, ‘재간둥이’로 통한다.
영화가 끝날 무렵, 송태섭과 정우성은 일본이 아닌 미국 아마추어 무대에서 낯선 유니폼을 입고 마주한다. 원작에는 없던 내용이다. 만화가 연재될 시기에 이 장면이 나왔다면 이노우에가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것이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현실로 만들었고, 그 배경에는 10년, 20년에 걸친 투자 및 육성 계획이 있었다. 이노우에 작가 역시 재단을 만들어 농구 유망주들을 지원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순간에 나온 송태섭과 정우성은 그간 그가 미국에 보낸 유망주들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뉴스에서는 한국에서의 <슬램덩크> 열풍을 여전히 1990년대와 연관시킨다. 우리 농구에 ‘미래’가 있던 시절이었다. 독자들과 관객들이 낭만과 젊음이 있던 그 시절을 추억하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스포츠 기자로 활동하며 농구가 ‘마이너 스포츠’ 혹은 ‘마니아 스포츠’로 전락하는 과정을 지켜본 내 입장에서는 그 엔딩을 본 뒤 감동만큼이나 아쉬움도 함께 몰려왔다. 과연 우리는 그 꿈을 지원해줄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계획을 수립할수 있을까?
손대범 KBS·KBSN 농구 해설위원. 농구 전문 잡지 <점프볼> 편집장을 지냈고, 12권의 농구 관련 책을 썼다. KBS·KBSN에서 농구 해설을 진행하며 유튜브 ‘농구대학’, ‘조손의 느바’ 등에 출연 중이다.
